
지난 2005년부터 취약계층의 아동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카드를 지닌 아동은 지역 식당이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해 밥을 사 먹을 수 있어 배를 곯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 사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아동급식카드 이용률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급식카드 사용의 어려운 점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게 싫다’ ,‘금액이 부족할까 봐 카드 내밀기가 꺼려진다’ ‘한 끼 4500원으로 먹을 곳이 없다’, ‘가맹점이 부족하다’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1일 한도 상향 등 제도를 비롯해 가맹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이뿐이랴. 실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방학 중에는 한 끼 평균 3~4천원 정도의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급식 카드를 달가워하지 않는 몇몇 상점 때문에 눈치 보기 일쑤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급식권을 손에 쥐었지만 아이들은 주로 편의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제도적 문제에 대한 지적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비난'만 있을 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탓한다고 해서 책임지 전가되지 않는다
얼마 전, SNS커뮤티에 게재된 ‘사장님이 사과한 이유’라는 카드뉴스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식당에서 식사하던 한 손님이 사장에게 다가가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을 가리키며 모처럼 나와서 돈 내고 밥 먹는 데 기분이 나쁘다고 컴플레인을 한 것. 이유인즉슨, 급식카드로 먹는 애들이 굳이 여기서 밥을 먹게 해야겠냐는 거다.
눈총을 주는 어른, 눈치를 보는 아이. 뭐가 잘못된 걸까.
‘소외된 계층’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 주저함 없이 모름지기 대부분 그렇다고 동의할 것.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도움의 주체는 다른 이에게 전가한다. 때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재벌의 환원에, 연예인의 기부에. 정작 우리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면서 국가를 나무라고 재벌을 비난하며 마땅히 지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미루고, 탓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중적 태도. 아이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야 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야 할 친구를 구분 지어준 적은 없는지, 남의 아이를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조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쉽게 판단했던 적은 없는지 개인의 도의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입을 모아 동의하는 ‘복지’의 진짜 실현은 노블레스오블리주와 같이 재벌들의 환원과 연예인들의 기부, 나라의 지원이 아닌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아동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어른들의 온정적인 시선과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다른 아이를 향한 어른의 마땅한 돌봄이 결국 부메랑처럼 내 아이를 향해 마주 잡은 두 손이 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질 때, 내 아이를 비롯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커다란 그늘이 돼줄 것이다.
"아이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사진:한경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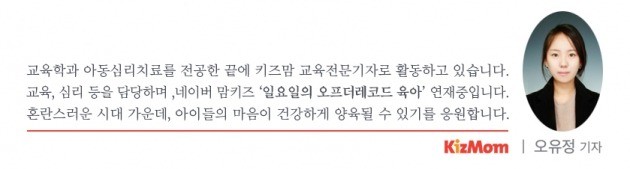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