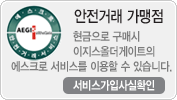#통계청
-

-
고물가에 '소주 가격' 왜 내렸지? 사장님 속마음 들여다보니...
불경기로 음식점·주점업 등 외식 소비가 둔화하면서 일부 업주들은 줄어든 손님을 되찾기 위해 술값을 내리는 '물가 역주행'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외식)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하락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맥주(외식) 가격도 작년 12월부터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이 같은 외식용 소주·맥주 가격은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하락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다.외식 소주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2005년 7월(-0.8%) 단 한 번뿐이었고, 외식 맥주 가격이 하락한 때도 1999년 7월부터 1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업계에서는 일부 음식점에서 손님을 식당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소주 1병 무료', '맥주 무료', '소주 반값'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주류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게 매출에 타격이 큰 메인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주류 가격을 인하해 고객을 유치, 떨어진 매출을 회복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편 가공식품 물가는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 품목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8 13:45:31
-

-
"저 친구는 자가, 나는 월세"...30대 청년 '주거 양극화' 뚜렷
30대 초반 청년 가운데 전세 세입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월세나 자가 거주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돼, 부동산 급등기 자산 격차 확대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분석해 1970~1974년생, 1975~1979년생, 1980~1984년생, 1985~1989년생 일반가구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분석 결과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1970~1974년생이 30대 초반이던 시기에는 월세 거주 비율이 17.3%였지만, 이후 1975~1979년생이 30대 초반일 때는 19.0%로 증가했다. 이어 1980~1984년생 20.8%, 1985~1989년생 21.3%로 월세 비율이 계속 늘었다. 즉 30대 초반에 '월세살이'를 하는 청년 비율이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이다.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30대 초반 자가 거주 비율은 1970~1974년생 48.1%, 1975~1979년생 46.6%, 1980~1984년생 51.1%, 1985~1989년생 49.0%로 확인됐다. 소폭 등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반대로 30대 초반 시기 전세 거주 비율은 계속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족 형성이 가장 활발한 3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점유 형태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들은 전세에서 자가로,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해석이
2025-03-27 12:11:28
-

-
‘취업 준비•실업•그냥 쉰다’ 청년 백수 120만명 돌파…작년보다 7만명 증가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을 보여준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수준이다.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한 420만 9천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천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천명이었다.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이었다. 작년(113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마찬가
2025-03-16 11:33:45
-

-
학생 수 줄었는데 작년 사교육비 총액 전년보다 증가…1인당 월평균 지출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 2023년(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사교육비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다.학년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90.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80.0%), 고등학교 1학년(70.2%)이 뒤를 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교·초등학교(각 7.8시간), 고등학교(6.9시간) 순이었다.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7.2% 늘었다.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4.4%↑)이다.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8000원, 참여 학생
2025-03-13 21:54:32
-

-
한국인 평균 소득은 얼마? '이 연령대' 男 연봉 최고라는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세전 기준 3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자보다 1.5배 높았고,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50대 남성(527만원)이었다.25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세전 기준 월 363만원으로 전년(353만원)보다 2.7%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뜻한다.평균소득은 2019년부터 300만원대가 된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4.1%) 늘었다. 중위소득도 2021년 250만원대 선을 돌파해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기업 규모별 평균소득은 대기업이 5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기업 349만원, 중소기업 298만원 순이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2배가량 높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평균소득 격차는 전년(305만원) 대비 소폭 줄었다.성별로 보면 남자 근로자가 426만원, 여자 근로자 279만원으로 남자가 여자의 1.5배 수준이었다. 전년보다 남자 근로자 평균소득은 3.0%(12만원) 늘었고, 여자는 2.8%(8만원) 증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근로자가 45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429만원, 30대 386만원, 20대 263만원, 60세 이상 250만원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소득이 높았고, 남녀 소득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235만원)였다.성별과 연령을 포함하면 50대 남성이 527만원으로 1위였다.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753만원)이었고,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2025-02-25 17:15:21
-

-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 40대가 가장 높아…소득 기준으로는?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한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지표는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하지만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아울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4 12:51:02
-

-
"반찬 없으니 김 싸먹자" 이제 옛말되나...가공식품 물가 '비상'
원재료 가격 상승과 높아진 환율에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1년 만에 가공식품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보다 높은 수치다.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2.0%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부쩍 올랐다.지난달 가공식품 중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고, 이어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참기름(8.9%), 간장(8.8%), 식용유(7.8%) 등 주요 조미료도 7~8% 상승했고,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식품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제품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추세다.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일 포카리스웨트를 비롯한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 올렸고, 대상도 지난달 16일부터 마요네즈 후추 등 소스류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다.SPC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부터 소보루빵을 비롯한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올린다고 밝혔으며, 롯데 웰푸드도 이달 17일부터 초코 빼빼로 등 26종 가격을 9.5%가량 인상할 예정이다.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월 가공식품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앞으로 시차를 두고 더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
2025-02-13 13:52:12
-

-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노인 40%는 '빈곤층', 女가 훨씬 더 심각
2023년 기준 한국 노인(65세 이상)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년 연속 조금씩 악화하는 추세다.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이는 전년 대비 0.1%P 높아진 수치다.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로 빈곤층 규모를 나타낸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빈곤선은 약 1879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40%는 매년 1879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중에서도 여성(43.2%) 노인이 남성(31.8%) 노인보다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눈에 띄게 높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6.3%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20년 38.9%를 기록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0.5%P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에는 0.1%P 증가해 2년 연속 악화했다.특히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빈곤율은 더 올라갔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4 13:48:15
-

-
지난해 취업자 수 0.6% ↑...증가폭은 '반토막'
2024년 한 해 동안 연간 취업자가 16만명가량 늘었지만, 전년보다 증가 폭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5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천명(0.6%) 늘었다.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만1천명 증가했다가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21만8천명 감소했고, 이듬해 36만9천명 늘었다.2022년에는 81만6천명 늘어나며 2000년(88만2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지만, 이어 2023년 32만7천명, 지난해 15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2년 연속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9천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도매 및 소매업(-6만1천명)과 제조업(-6천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천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6천명 늘었지만, 20대에서 12만4천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2월 47만3천명 줄어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첫 감소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산업군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15 08:55:14
-

-
10월 출생아 수,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
10월 출생아 수가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이는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엔데믹 이후 몰린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10월 사망자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327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10월 이혼 건수는 7300건으로 1년 전보다 616건(7.8%)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26 14:54:59
-

-
서울 가구수, 14년 뒤 정점 찍고 하락...평균 가구원 수도 '뚝'
서울에 사는 가구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3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30년 뒤 평균 가구원 수는 전국이 2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을 12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2천166만4천가구로 추산된다. 총가구 수는 2041년 2천437만2천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52년에 2천327만7천가구가 된다.서울의 가구 수는 2022년 408만 1천가구로, 203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427만6천만가구를 기록하겠으나 2039년부터 줄어들겠다. 이후 2052년에는 396만8천만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부산·대구는 2032년, 울산은 2034년 이후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감소한다.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과 탈서울 행렬로 2022년 537만에서 2044년 668만가구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들어 2052년에는 653만5천가구가 되겠다.전국 가구 수는 2022년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았으나,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2명 이하로 내려가겠다.2022년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지만 이후 점차 줄어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022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최고 세종·경기에서 2.41명, 최저 경북 2.11명 수준이다.30년 뒤에는 세종마저 1.93명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12 13:21:05
-

-
서울 주민 6000명, '여기'로 이사가요...이동 인구 3년 만에 최고
지난달 살던 곳에서 떠나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집계된 이동자 수는 52만1000명이다. 이는 전년 10월(50만7000명)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매년 10월 이동자 수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약 54만명을 기록했고, 그다음 해에 45만6000명으로 많이 감소한 뒤 2023년 50만7000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올해는 52만1000명으로 증가해 2021년 이래 가장 많은 이동자 수를 보였다.이 중 시도 내 이동자 수가 35만7000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31.5%였다.통계청은 최근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이동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시도별로는 경기(5831명), 인천(1555명), 충남(1394명) 순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고, 서울(-6280명), 부산(-1388명), 경북(-674명) 순으로 순유출 인구가 많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9 15:08:12
-

-
3분기 합계출산율 늘었다…연간 출생아 수 증가 '청신호'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약 8년 만에 올랐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오름세다.분기 출생아 수는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분기 691명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2015년 4분기 1.1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0.76명)까지 하락하다가 2분기(0.71명)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모두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증가했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다.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
2024-11-27 14:37:48
-

-
일·취업 준비 모두 "손 놨다"...'쉬었음' 청년 8만2천명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5월 기준 23만 8천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청년은 8만2천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는 6만9천명(28.9%), '육아·가사를 했다' 3만5천명(14.8%), '진학 준비를 했다' 1만1천명(4.6%) 순으로 나타났다.미취업 기간별로 보면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 기간인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높아졌고,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천명에서 2022년 8만4천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2024-09-19 17:17:32
-

-
무자식 상팔자? 男女 달랐다...'솔로'와 '애엄마' 소득 비교해보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솔로' 여성에 비해 취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솔로 남성보다 자산·소득이 높았다.10일 통계청은 국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24~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통계를 발표했다.2022년 기준, 25~39세 청년 중 33.7%는 배우자가 있었다. 전년에 비해 2.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자 40.4%, 남자 27.5%로 유배우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이 60.3%, 30대 초반 34.2%, 20대 후반 7.9%였다.유배우자 비중은 수도권(31.7%)이 비수도권(36.1%)에 비해 낮았고, 시도별로 가장 높은 곳은 세종(51.4%), 가장 낮은 곳은 서울(25.0%)이었다.유배우자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73.9%로 무배우자(7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유배우자(91.1%)가 무배우자(73.5%)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유배우자(61.1%)가 무배우자(71.8%)보다 낮았다. 이는 여성의 혼인 직후 경력 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다.25∼39세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유배우자가 4천56만원으로 무배우자(3천220만원)보다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유배우자(5천99만원)가 무배우자(3천429만원)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무배우자(3천13만원)가 유배우자(2천811만원)보다 더 높았다.주택 소유 비중 역시 유배우자가 31.7%로 무배우자(10.2%)보다 더 컸고 남녀 모두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자의 주택자산 가액은 무배우자가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2022년 유배우자 청년 중 자녀가 있
2024-09-10 13:46:00